[신간을 기다립니다] 문진영 소설가에게 - 이서수 작가
우리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조금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해요. 간간이 올라오는 진영 씨의 피드를 볼 때마다 늘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신작 소식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고요.
저는 새로운 소설을 쓰느라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천변을 걸어요. 그리고 진영 씨의 첫 소설집 『눈속의 겨울』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집에 실린 열 편의 단편을 읽는 동안 진영 씨의 신작을 더욱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진영 씨가 올린 피드에 댓글도 달았지요. 조용하지만 열렬히 기다리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심하다가, 결국 한 문장밖에 쓰지 못했지만요. 그날 밋밋한 문장으로 전했던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 다시 간곡하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소설집 『눈속의 겨울』에 실린 단편을 읽으며 저는 ‘거리’에 대해 자주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쾌적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떠올린 답은, 안아주기에 멀지 않고 도망치기에 가깝지 않은 거리,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관계는 안아주고 도망치는 것을 반복하며 실패로 향하다가, 나의 유약함을 짧게 탓하고 상대의 냉정함을 길게 탓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잊고 누군가와 다시 거리를 좁히고 벌리는 일의 반복 같아서요. 「일인용 소파」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실패하지 않는 관계란 없는 거 같아. 모른 척할 수는 있어도.”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았어요.
‘실패하지 않는 글이란 없는 거 같아. 모른 척할 수는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쾌적한 거리를 생각하던 저는 어느새 글과 작가 사이의 쾌적한 거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글과 작가 사이의 쾌적한 거리라는 게 과연 있을까 싶지만, 어쩌면 이 또한 안아주기에 멀지 않고 도망치기에 가깝지 않은 거리가 아닐까요. 내 글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줄까 그런 애틋한 마음을 품다가도, 다음 날이면 내 글이 나를 해칠 수도 있으니 아주 멀리 도망가서 숨어버려야지 그렇게 겁먹은 마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것이 과연 쾌적한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독자와 작가 사이의 쾌적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떠올릴 수 없었어요. 독자와 작가는 또 다른 자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아예 모르는 타인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는 결론만 겨우 내렸지요. 저는 좋아하는 작가들에게서 늘 저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해요. 그런 재미로 소설을 읽으면 경험이 무척 풍부해지는 기분이 들고, 그런 고양된 마음은 작가에 대한 애정으로 모아져 다음 작품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영 씨의 글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애쓰는 사람보다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어쩌면 저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단편 「눈 속의 겨울」에 이런 문장이 나오지요.
“다들 너무 애를 써.”
저는 이 문장을 오랫동안 곱씹었어요.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착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애쓰지 않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주는 진영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요.
사실 저는 애쓰지 않는 사람인지, 애쓰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애쓰지 않는 사람치고는 욕심이 많고,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나 애쓰는 사람치고는 결과에 태연하고, 지나간 일을 잘 잊는 편이에요. 어쩌면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글쓰기로 희석시키는 습관 덕분이겠지만요.
「나비야」엔 미선과 미희 자매가 나오지요. 저는 이 단편을 읽고 진영 씨의 소설 속 인물들이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단 생각을 했어요.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 능동성과 수동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를 살펴보고 싶었어요.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이고, 보기 좋은 정도로 애쓰는 것이지만, 살아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삶의 태도이고,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감당하거나 보기 안쓰러운 정도로 인내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영 씨의 소설을 읽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의 태도일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아니지. 어쩌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건지도 몰라.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끌어안으며 착실하게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더 이상 회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껏 저는 달리는 행위가 삶이라고 생각하고, 달릴 때 맞닥뜨리는 풍경은 삶의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반대로 생각하게 된 거죠.
풍경이 삶이라면, 진영 씨의 소설 속 인물들이 왜 변하거나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살아‘내’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 어제의 내가 어떠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나아가 어제와 오늘의 구분은 불가능함을 아는 것. 시간은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처럼 흐르는 것임을 아는 것.
이탈을 자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진영 씨의 소설 속 인물들이 신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진영 씨가 그리는 인물들에게 이탈은 이미 일상처럼 변모해 버린 상황임을 모른다면요. 저 역시 단순한 일상 속에서 이탈을 자주 발견해요.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고민 때문인데, 그것이 소설을 쓰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저는 지나간 일은 자주 떠올리지 않지만, 지나간 사람은 자주 떠올려요. 결과엔 태연하지만, 만남엔 허둥대요. 그렇지만 진영 씨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나답게 편안히 있어도 된다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어요. 당신답게 있어도 괜찮다고, 애쓰지 않아도 풍경이 당신에게 다가온다고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은 애를 많이 써봤어요. 진영 씨를 만난 적이 없어서 쑥스러운 고백을 담은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진영 씨,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쓰고 있을까요.
지나친 애씀 없이, 응집된 찰나를 기록하며, 마치 산책하듯이요.
- 이서수 드림
추천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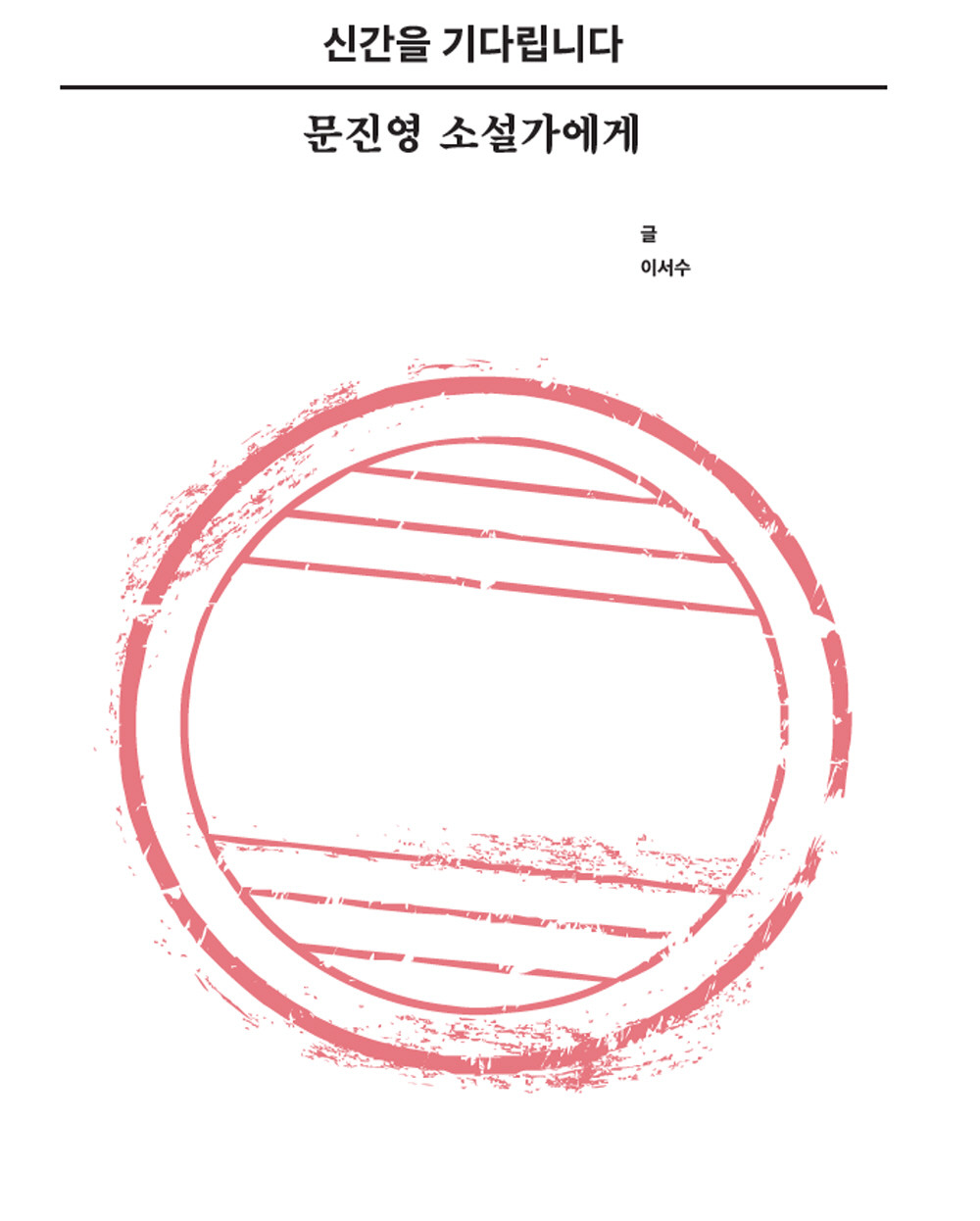


![[신간을 기다립니다] 윤성희 소설가에게 - 송지현 소설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5/1/8/55184b3fcd4aef57c5bce0f01bbc8dc9.jpg)
![[신간을 기다립니다] 김우주 작가에게 - 김소영 작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6/9/5/66950fd5a68acd0db18fdd394da73ea6.jpg)
![[신간을 기다립니다] 만화를 찢고 나온 정지우 작가에게 - 김민섭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c/b/6/0cb67dc0b598aef37325218f28f9ebc2.jpg)
























































